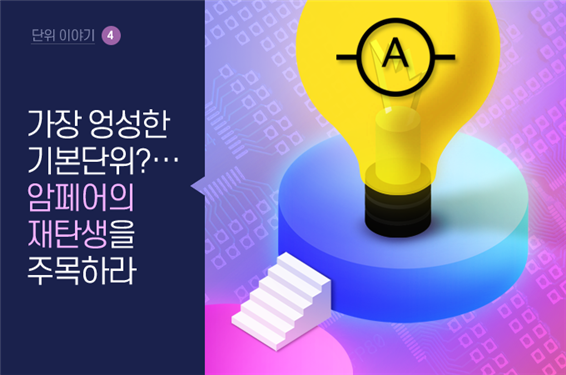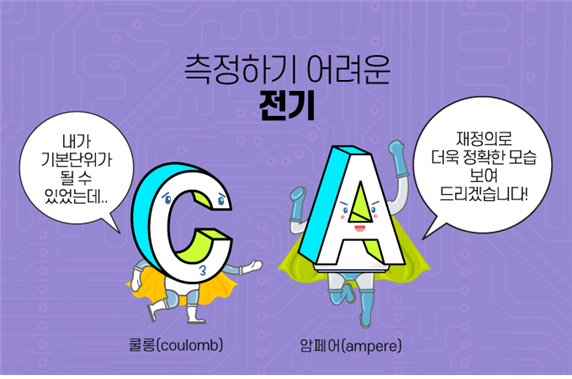가장 엉성한 기본단위? 암페어의 재탄생을 주목하라
새롭게 재정의되고 있는 기본단위, 그 중에서 오늘 만나볼 단위는 킬로그램(kg) 못지않게 재정의가 시급한 단위입니다. 바로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A)입니다.
암페어는 1948년 제 9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의된 후 1960년 총회에서 국제 기본단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암페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페어(A)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 m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1 m 당 2×10-7 뉴턴(N)의 힘을 생성하는 일정한 전류다"
혹시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바로 이것이 암페어의 문제점입니다. 킬로그램 원기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암페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론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한히 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이라는 전제조건은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진공상태까지 더해지니 '암페어는 혹시 상상의 단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갖게 되죠.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표준기관에선 간접적으로 암페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셉슨 전압표준기와 양자홀 저항표준기를 통해 전압(V)과 저항(R)을 각각 구현한 후, 옴의 법칙(I=V/R)에 따라 전류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러 단계에 걸쳐 정밀한 측정을 요구할뿐더러, 이렇게 구현한 전류의 암페어는 조셉슨 전압표준기와 양자홀 저항표준기의 이론 값에 비해 100배 이상 부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죠. 표준과학자들 역시 '가장 엉성한 단위'라고 지적하는 암페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암페어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먼저 기존의 암페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길이와 단면적을 잠시 제외한다면, 1 암페어는 '2×10-7 뉴턴(N)'의 힘을 생성하는 전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는 원형 단면적이 1 m 간격으로 평행하게 있다고 한들,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와 '전하'입니다.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각 전자들은 전하라고 하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동한 전자의 개수와 개별 전하량을 곱한다면 전체 전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2 kg짜리 짐(개별 전하량)을 지고 있는 사람 100명(전자의 개수)이 동시에 관문을 통과했다면, 총 짐의 질량은 200 kg(총 전하량)이 됩니다.
표준과학자들이 새롭게 생각한 암페어는 이처럼 간단하게 다시 정의됩니다. 엉성한 1 m 속 도체 사이의 힘이 아니라 '단위시간 당 일정한 전하의 흐름'으로 재정의가 되는데요. 명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흐른 전자의 수를 센 후, 전하량을 곱해주기만 하면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자 1개가 갖는 기본전하량(e)입니다. 기본전하량은 상수로 고정되며, 현재 e =1.602 176 634×10-19까지 계산되었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 국제도량형총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전자를 셀 도구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도구는 '단일전자펌프 소자'입니다. 단일전자펌프 소자는 전자를 한 개씩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작은 크기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소자로서 우물 모양의 소자 공간을 만들고, 앞과 뒤의 장벽을 순차적으로 열고 닫으며 전자를 하나하나 제어하고 셀 수 있습니다. 단일전자펌프 소자를 열고 닫는 주기, 즉 주파수(f)는 현재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이 새로운 암페어가 됩니다. 다만 전자를 한 개씩 제어하고 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1 초에 전자 10억 개를 전송할 때, 100개 이하의 오류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표준연은 재정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오류를 10개 이하로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페어의 정의가 복잡했던 것은 전기 자체가 양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전기 그 자체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는데 100이라는 전기가 필요할 경우, 발전소에서 즉각적으로 생산한 100의 전기가 공급됩니다. 만약 200을 생산했다면 어떨까요? 100만 쓰고 100은 저장해둘 수 있을까요?
답은 No,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전지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단위가 바로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C)'입니다. 1 쿨롱(C)은 1 초(s) 동안 1 암페어(A)가 흐를 때 전체 전하량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1 암페어는 단위시간 1 초 당 1 쿨롱의 전하량이 흐를 때 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즉 암페어는 쿨롱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한 단위인데요. 앞서 설명되었듯 전기는 양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쿨롱을 먼저 정의하고 암페어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암페어를 먼저 정의하고 쿨롱이 유도된 형태입니다. 암페어가 '기본단위', 쿨롱이 '유도단위'가 된 것이죠.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측정 기술이 가장 미흡했던 분야였는데요. 암페어의 재정의가 가져올 전기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출처] KRISS 공식 Blog- Mail|작성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롭게 기억될 단위 명칭, 캘빈(K) (0) | 2018.09.03 |
|---|---|
| 새롭게 기억될 단위 명칭, 캘빈(K) (0) | 2018.07.23 |
|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A)에 대한 국제단위 재정의를 위한 전류표준기 개발 박차 (0) | 2017.12.20 |
| 부피의 기본단위인 "mol" 을 탄소(c)에서 "아보가드로 상수" 로 재정의하다. (0) | 2017.11.29 |
| 7개 SI기본단위 중의 하나인 kg정의가 130년 만에 변경되는 소식 (0) | 2017.10.25 |